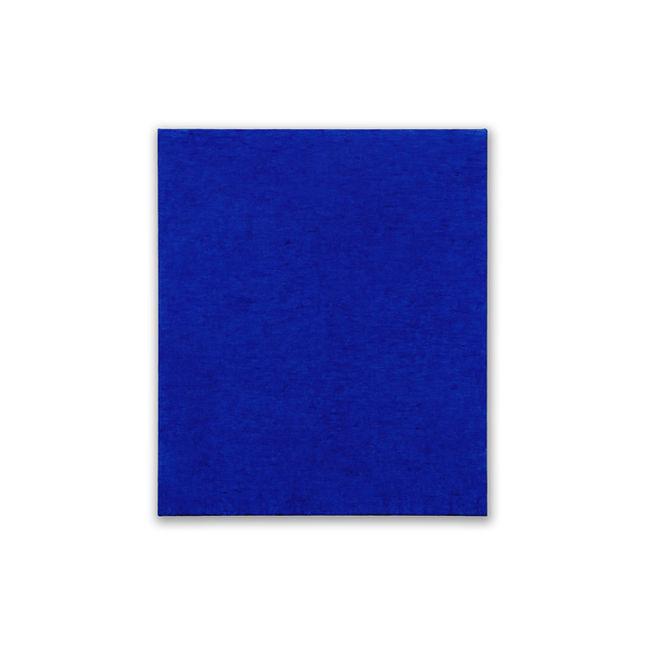김근태, 김춘수, 신수혁
적(積)_비움의 여정(toward emptiness), 심연의 표상
한국인 특유의 물성과 심연의 정신을 바탕으로 구성된 단색화는 ‘한국 추상회화’의 깊이를 다채롭게 조명하는 동시대 한국미술의 브랜딩이다. 아트프로젝트 씨오(대표 임은혜)의 이번 기획전은 ‘層_고요하며 깊다’, ‘空_흔적으로 비추다’를 이은 세 번째 전시로 비움을 향한 허실상생(虛實相生)의 미학인 ‘적(積)’의 개념을 더해 ‘자기초월성’을 실험하며 궁극의 화면으로 나아가는 김근태(Kim Keun Tai), 김춘수(Kim Tschoon Su), 신수혁(Shin Soohyeok) 3인의 작가를 선정했다. 積(쌓을 적) 자는 禾(벼 화) 자와 責(빚 채) 자가 합쳐진 모습으로, 볏단이 포개진다는 뜻에서 ‘쌓이다’, ‘누적되다’라는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쌓는 것은 비우기 위한 명상적 행위로, ‘비움과 채움’이 함께 있음을 뜻하는 허실상생을 빗댄 것이다. 실제로 ‘허실(虛實)’은 노자의 도가사상에서 비롯된 개념으로, 비움과 채움의 결합은 우주 만물의 근원과 닿아 있다. 독일의 철학가이자 수학자인 라이프니츠(Gottfried Wilhelm von Leibniz)는 현대 컴퓨터의 원리인 2진법 체계를 정립하면서, 컴퓨터와 정보통신기술이 인류의 삶에 침투한 ‘비물질 시대’에 대해 원자와 비트의 이원적 대립 항인 ‘실재’와 ‘가상’, ‘물질세계’와 ‘가상세계’의 분열을 이야기한 바 있다. 인공지능(AI)·사물 인터넷(INTERNET OF THINGS)·빅데이터와 같은 기술시대 속에서 우리가 되찾아야 할 가치는 인간성 회복을 향한 ‘정신의 발견’이다.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이 난무하는 시대 속에서, ‘예술가의 사유’를 작품과 일치시키는 행위는 석분과 유화를 재료로 하여 수차례 중첩해가며 무위(無爲)로 나아가는 김근태 작가, 청화백자와 푸른 미감 너머의 자유를 연상시키는 울트라 마린 (Ultra-marine)의 김춘수 작가, 수평과 수직으로 시공간의 무한한 경험을 채워가는 신수혁 작가에게서 반복적으로 발견된다. 이번 ‘積_비움의 여정’은 포스트 단색화라는 확장의 경계를 되짚는 동시에, 동시대 미술 속에서 어떻게 동양철학의 천인합일(天人合一)을 실현할 수 있을까를 좇는 계기를 마련한다.
김근태 작가는 ‘분청사기’에 담긴 아래로부터의 정서, 인본의 심성 ‘인(仁)’을 좇는다. 자아를 객관화하는 물화(物化)의 과정을 속에서 수평선으로 대표되는 작가의 이미지 속에는 다양한 층차와 만나는 시공간의 공유가 자리한다. 분청사기 200여 년 역사의 정점인 덤벙 기법의 시야를 보듯 ‘비정형성 사이의 완전함’이라는 균형의 결과가 작품 사이에 스며있는 것이다. 작가에게 중요한 것은 ‘시공간의 파장’이다. 그 간극들이 모여 작품 전체를 이루고 이를 바라보는 수평의 눈이 시공간의 결핍을 예술로 승화시키는 것이다.
김춘수 작가는 ‘ULTRA MARINE’에 담긴 넓고 깊은 자연의 에너지를 화폭에 옮긴다. 얕음과 깊음을 오가는 묘한 뉘앙스 사이에는, 회회청(回回靑; 코발트 성분의 안료)을 연상시키는 귀한 ‘마음의 색(the color of mind and wavelength)’이 자리한다. 청화(淸化; 푸른물결의 담화)로 물든 ‘선비의 연적’처럼 청색으로 꽉 채운 화면에는 물감이 서서히 올라가며 잠식해 간 깊이의 흔적이 자리한다. 작가에게 청색은 세상과 통하는 창(窓)이다, 우주와 존재를 연결하는 블랙홀과 같이 ‘깊은 푸름’은 심연을 쌓아가며 새로운 가능성의 길을 연다. 유화지만 묵화 같은 농담(濃淡)의 표현은 수 천년의 역사를 머금은 동양화의 푸른 먹을 연상시킨다. 면(面) 그림 중심의 서양화에선 느낄 수 없는 질료의 한계를 넘어서는 탁월함, 조선시대 선비의 ‘시화(詩畫)’를 연상시키는 푸름 속에는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충만한 에너지’가 아로 새겨져 있다.
신수혁 작가는 수직·수평의 stroke(일종의 타법)으로 생명과 휴머니티를 좇는다. 규칙적으로 보이는 직렬과 병렬의 구조는 미세하게 엇갈리는 ‘규칙 속의 비규칙’을 통해 우리 삶의 ‘틈(闖)새’를 어루만지고, 견고한 구조 안의 말캉말캉한 균형들을 ‘교차/반복’을 통해 메워가는 ‘정감(情感; 정조와 감흥)의 합일’을 보여준다. 인간 사이의 노이즈를 작품으로 흡수해 새로운 사유로 몰입시키는 구조는, 수직·수평의 스트로크 속에서 작가의 숨결이 만들어낸 ‘정반합(正反合)’의 스토리텔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3인의 작품들은 인간의 행위가 만들어낸 최상의 미감인 동시에, 반복과 명상이 그려낸 겸손한 행위로 요약된다. 쌓으며 비워내는 이율배반적 관조를 통해 ‘단색화’ 너머에 깃든 ‘한국인 특유의 시대정신’과 만나기를 기대한다.
안현정(미술평론가, 예술철학박사)